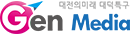투명하고 공정한 집행기준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돼야

[편집자주]고광률은 소설가이자 문학박사이다. 1990년 엔솔로지(『아버지의 나라』 실천문학)에 「통증」으로 등단 이후, 장편소설 『오래된 뿔』(은행나무) 등을 발표하였다.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반 서울에서 잡지사 정치 관련 기자와 출판사 편집자를 지냈고, 대중소설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뒤, 문예창작 및 미디어 관련 출강을 하고 있다.
지역 신문3사에 광고비 몰아줘
지난 6월 27일 <다른시각>의 기사에 의하면 언론사들을 대상으로 대전광역시와 충남도의 광고비 집행이 이렇다 할 기준 없이 특정 언론사에 편향적으로 쏠려 문제가 많다고 지적된 바 있다. 기사에 의하면 대전일보·중도일보·충청투데이가 전체 광고비 51억여 원 중 14억 1000여만 원(36퍼센트)에 달하는 광고수주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었다.
그런데 8월 10일자 <다른시각> 보도에 따르면, 대전시와 충남도 교육청의 광고비 집행은 더욱 편향적인 것으로 나타나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관련기사 링크:) 앞서 말한 언론 3사에 40퍼센트가 넘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난 때문이다. 중도일보 충청투데이 대전일보 금강일보가 대전시교육청으로부터 각각 1억 2550만원, 1억 950만원, 1억 420만원, 1억 100만원을 받았고, 역시 같은 언론 4개사가 충남도교육청으로부터 각각 1억 632만원, 1억 3060만원, 1억 1100만원, 6940만원을 받았다. 대전시와 충남도 교육청의 전체 광고비 가운데 40퍼센트가 넘는 액수인 것이다.
물론 양 교육청은 신문 구독자 수나 인지도, 영향력(파급력) 등을 고려했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대전시와 충남도의 광고비 편향집행 관련 칼럼에서도 짚었듯이 매스미디어의 영향력은 서로 나름대로의 차별성과 변별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할지라도 매스컴 전체 시장으로 볼 때 특정 3사가 광고비를 40퍼센트나 쏟아 부을 만큼 영향력(또는 효과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더욱이 노출도와 접근성이 압도적으로 뛰어난 소셜미디어를 포함하여 고려한다면 이해하기 쉽지 않은 편향 지급이다.
기사가 이미지 메이킹 수단인가
언론과 공공기관의 ‘유착’은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인데, 좀처럼 개선되어지지 않는다. 한국 현대사에서 잘못된 정치권력이 저지른 죄악에 버금갈 만큼, 언론의 잘못이 저지른 죄악 또한 크다(최근 개봉작인 《택시운전사》만 봐도 양심과 정의에 대한 개념이 없는 언론사 관계자들을 볼 수 있지 않은가).
기사도 상품이다. 굳이 이걸 부정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기사는 여느 상품과 다르다. 기사는 사실에 입각해야 하고, 사실을 바탕으로 한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의견이어야 한다. 그런데 기사가 특정기관의 이미지를 만들어주고, 홍보매체로 전락을 하고 있다. 다시 말해 언론 고유기능인 비판과 견제보다는 특정기관이 알리고 싶어 하는,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들을 포장하여 전달하는 것이다.
촌지는 불법이다. 김영란법에 따라 접대와 향응도 불법이다. 그러나 광고는 합법이다. 불법은 위험부담이 크다. 그러나 합법은 ‘성실하게’만 하면 암묵적 ‘거래’가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럴 리야 있겠는가 만은 좋은 이미지 만들어주고 홍보성 기사 좀 써주는 것이 어디 불법인가, 라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될 것이다. 시민의 알권리를 디테일 또는 친절하게 행세해준 것이 아닌가, 라는 억지를 부려서도 안 될 것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거래’를 하라
광고비 집행은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 <다른시각>이 광고비가 일부 언론사에 치중됐는데, 그 기준을 밝히라고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언론이 정의롭고 공정해야 나라가 산다. 정치권력과 유착한 언론으로 인해 낭비되고 있는 국력이 보이지 않는가. 어느 해직기자가 언론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고 부르짖지 않는가. 정확히 말하면, 언론이 살아야 정의가 살 수 있고, 정의가 살아야 나라가 살 수 있다는 뜻일 것이다. 정치권력과 언론권력(언론은 본래 권력이 없다. 그런데 있다)이 서로 이해관계로 얽혀 부당한 ‘친교’를 나눈 결과, ‘촛불혁명’까지 불러와 시민의 힘으로 생성되는 국력을 발전 동력이 아닌 잘못을 바로잡는 저항의 동력으로 소모시켰고,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사드 배치와 야합에 가까운 위안부 합의 등으로 국론분열과 국가위기를 초래하지 않았는가. 국력 소모나 국가 위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자라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도덕성과 정의감 인식 및 판단에 심각한 폐해를 끼쳤다는 점이다. 국가를 혼돈과 파국으로 몰아넣는 잘못을 저지르고도 우기고 버티면 살아남을 수 있다는… 아니 우기고 버티면 언젠가는 불의도 정의로 둔갑할 수 있다는….
그러나 일부 언론은 이런 상황에서도 반성과 성찰 없이 이해관계에 입각한 논지를 견지하고 있다.
언론사는 구독료와 광고비로 회사를 운영하고, 기사를 만들어 팔기에, 기사는 상품이다. 개별 기사 자체만을 돈 주고 사지는 않으나, 기사가 실린 신문(또는 인터넷 사이트)을 사는 것이니 상품이 맞다. 소비자(시민 독자)는 순정하지 않은, 제조공정이 투명하거나 공정하지 않은 상품을 원치 않는다.
그러니 자본주의사회의 기본인 언론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라도 광고비 집행 기준을 엄중히 밝혀야 할 것이다.

2017.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