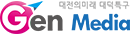문자인식 기술 통해 우편집중국 분류 자동화
“아이디어 상용화‧자생력 강화 시간 필요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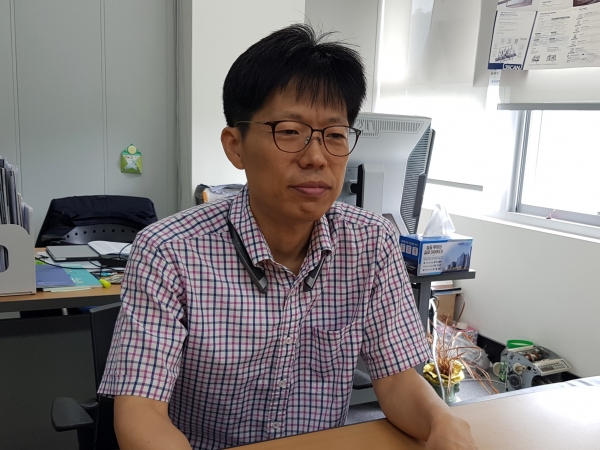
“기술 기반 기업들이 한파를 피할 곳이 필요하다”
AI‧영상인식 기술을 통해 ‘스마트 자동화’ 연구·개발을 진행 중인 '가치소프트' 김호연 대표의 말이다. 김 대표는 대전에서 영상 검출, 자동 분류, 문자인식 시스템 등을 통해 물류 자동화 분야를 이끌고 있다. 최근 세계 최대 이커머스 기업인 미국 아마존이 AI와 로봇에 의한 물류 업무 자동화를 선언하면서 물류자동화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관련 기술을 개발 중인 김 대표를 만나 국내 기업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들어봤다.
김 대표는 과거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우정물류기술 연구부에서 물류 관련 기술을 연구했다. 김 대표가 가치소프트를 시작하게 된 건 2012년부터다. 학생 시절부터 창업에 관심이 많았지만 전문연구요원으로 연구기관과 연을 맺으면서 그로부터 13년간 연구원으로 근무했다.
김 대표는 “연구년 동안 미국에 갔다가 다시 ETRI로 돌아왔는데 마침 연구원 내부에 6개월가량 창업을 지원해주는 예비창업제도가 생긴 게 사업을 시작한 결정적인 계기였다”고 말했다. 그렇게 시작한 가치소프트는 현재 14명 규모로 늘어났다. 창업 당시 ETRI 내에서 시작했지만 2년 뒤에 융합기술연구생산센터로 옮겼다. 이곳에서 지금의 사무실과 기술 테스트를 위한 생산 공간을 이용하고 있다. 그는 “사업을 시작한 후에 ‘아이디어’와 ‘상용화’ 사이의 간극이 크다는 걸 느꼈다”며 “(사업을 시작하는 것에 대해) 약간은 쉽게 생각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지만 너무 어렵게만 생각했다면 시작도 못 했을 것”이라며 웃었다.
문자인식 기술로 사업을 시작한 김 대표는 기술력을 축적해 물류 분야 전반에 대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가장 주력하는 기술은 ‘물류자동화’다. 택배 화물을 목적지별로 구분하기 위해서는 화물 고유의 정보를 읽어야 한다. 바코드 또는 주소명을 통해 도착지 주소를 데이터 정보로 바꾸게 되는데 가치소프트의 화물바코드 스캐너가 이러한 작업을 돕는다. 물류 분류 과정에서 다면스캔이 가능한 고속화물 스캐너는 가치소프트의 것이 국내에서 유일하다.
김 대표가 궁극적으로 목표하고 있는 건 물류의 ‘스마트자동화’다. 학교에서 인공지능을 전공한 김 대표는 딥러닝을 통한 영상인식 기술도 개발 중에 있다. 그는 “제약 분류와 관련해서도 다른 업체들과 협의 중에 있다며 연내 기술적으로 완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마트 자동화의 장점에 대해 김 대표는 “인력에 드는 비용은 줄이고 작업 속도는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예로 우편 집중국자동화와 관련해서 현재도 가치소프트의 기술이 녹아있다. 2015년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우편번호가 6자리에서 5자리 도로명주소로 변경되면서 전국 집중국의 우편분류기가 업그레이드될 때 가치소프트의 주소인식 기술이 적용됐다. 김 대표는 “지금은 우체국에서 등기나 택배를 접수할 때 주소명을 사람이 일일이 수작업으로 입력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작업도 자동화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물류자동화는 해외에서도 많이 시도되고 있는 기술”이라며 “국내에서도 쿠팡 등 물류업체들이 배송과 관련해 속도와 편의성을 높이려고 많이 노력 중이지만, 아직 기술적인 진보에서는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보다 뒤처지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규모가 있는 물류현장에서는 국내 기술보다 외국 기술을 쓰는 편”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물류 기술과 관련한 연구개발은 민간 주도로 이뤄지고 있다”며 “최근 정부에서도 관련 연구비를 조금씩 책정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현재 기술기업들이 처해있는 상황에 대해 고충을 털어놨다. “현재 민간과 공공기관의 기업 투자가 이뤄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투자문화는 실리콘밸리와 많이 다르다”며 “자금뿐만 아니라 회사에 필요한 영업 영입, 사업 기회 제공, 재무 컨설팅을 제공해주는 실리콘밸리 문화에 비하면 한국에서는 아직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 창업 관련 정책이 예전보다 많이 좋아져 중소벤처기업부의 연구개발과제 카테고리도 세분화됐고 지원 프로그램이 많아져 초기기업들이 과제를 받고 시작하기 좋아졌다”면서도 “중간 단계 기업들에게는 애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사업을 시작한 지 여러 해를 넘기고 스무명 남짓한 기업의 경우, 한 단계 점프를 해야 하는데 기술 검증과 사업 기회 부재의 악순환인 반복된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처음 사업을 시작하며 기술이 있고 아이디어가 있을 지라도 이를 상용화하고 시장을 개척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수년에 걸릴 수도 있고 결국 실패할 수도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 빠진 기업들을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규모가 되어야 사업 다각화에 도전하고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려면 사람을 뽑아야하는데 일정 수준의 지원책 없이는 기업 성장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쟁력 강화에 대한 질문에 그는 “분명 자생력 문제도 있다”며 모두 지원해주자는 건 아니라고 강조했다. 다만 한파가 몰아치면 추위를 피할 곳이 필요하듯이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기초 화학소재 국산화 문제도 같은 맥락이라고 말했다. “국내에 관련 기술이 없는 게 아니다”라며 “실적이 없으니까 대기업에서 사용을 하지 않고 실적을 내보일 기회가 없으면 더 나은 기술을 쌓을 여력이 안 된다며 정부가 시범사업이 됐든 최종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